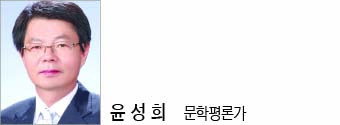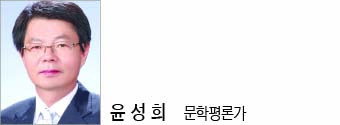장항제련소 굴뚝
윤성희의 만감萬感
2022.01.14(금) 09:38:25 | 도정신문
( scottju@korea.kr)
scottju@korea.kr)
굴뚝이 내뿜던 구름 닮은 연기
우리의 ‘밥벌이’이자 ‘독’이었던
대한민국 근대화 격동의 목격자 1936년생이면 올해로 만 86세의 고령이 되는 연세다. 86세의 병자년 쥐띠 어르신에게 장항제련소는 갑장이다. 그 연배의 어른들이 우리나라 근대화의 격동과 함께 했던 증인이듯이 장항제련소 또한 대한민국 성장의 역사를 지켜온 목격자다.
장항제련소에도 부침의 역사가 있었다. 초기에는 금·은·동·아연과 같은 비철금속을 제련하다가 산업 생태계의 변화와 함께 조업 품목을 수시로 바꿨다. 이후 쇠락을 거듭하더니 지금은 폐허가 됐다. 그 과정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장항제련소 굴뚝이다.
굴뚝은 멈춰 서 있다. 120m의 바위산 정상에 90m의 몸을 곧추세운 수직의 굴뚝은 더 이상 연기를 내뿜지 않는다.
박제된 새, 항구로 끌어 올려진 폐선처럼 굴뚝은 죽어 있다. 굴뚝이 살아 있을 때는 사람들도 북적거렸다. 굴뚝은 압도적으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다.
장항제련소 굴뚝은 내 기억의 밑바닥을 이루는 원형질이다. 요즘 애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니터를 봤다면 나는 시력이 생기자마자 굴뚝 연기를 봤을 것이다. 어느 날은 시커멓게, 어느 날은 뽀얗게 쏟아져 나오는 연기를 보면서 그것이 하늘의 구름을 닮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장항제련소 굴뚝의 연기는 키 큰 여자의 바람에 나부끼는 긴 머릿결 같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굴뚝의 연기는 바람의 물성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가시적 증거였다. 어머니는 연기가 흐르는 방향을 봐가며 빨래를 널고 걷었다. 자칫 바쁜 일상에 정신이 팔려 공기의 흐름을 간과하면 빨랫감에 구멍이 나기 일쑤였다. 연기의 낙진이 나일론은 구멍 낼 수 있어도 사람의 폐를 갉아먹을 수 있다는 위험은 눈치채지 못했다.
노동자 시인인 조기조도 거기까지는 몰랐던 모양이다.
“어려서 나는 장항제련소 굴뚝을 바라보며 기다리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연기만 뿜어 올리는 것이 아니라 오포 소리까지 들려주는 굴뚝을 바라보며 밥때를 기다렸고 간조날의 아버지 퇴근을 기다렸다”고만 썼다.
굴뚝의 연기가 누군가에게는 밥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독이었다. 밥이며 독이었던 그것을 고스란히 뒤집어쓴 장항은 많은 펀치를 두드려 맞아 지쳐버린 복서처럼 만신창이가 된 채 시름시름 앓고 있다. 텅 빈 몸을 버티고 서 있는 고향 굴뚝을 보는 마음이 짠하다.